티스토리 뷰

[ 밑줄/연결 ]
지도자들에게 요구되고 또 필요한 덕목은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능력과 새로운 담론 창출 능력이었다.
그들의 지도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또 인정받도록 했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언어 사용 능력이었기 때문이다.

---> 동의를 했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었다.
--->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없어 짜증이 났고, 다 읽고 버려 버렸다.
---> 자기의 능력을 벗어 나서 쓸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자.
(CEO의 의사소통 능력과 담론 창출 능력)
특히 담론에 의한 설득은 상대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담론은 강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잠재적 힘(권력)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에밀 방브니스트(Emile Benveniste)는
"우리는 타인에게 말을 하며 그들 역시 말을 한다. 이것이 인간 현실이다."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은 언어 속에서이며, 또한 언어를 통해서이다.
언어란 실제로 현실 내에서 '자아' 개념의 토대가 된다."
언어는 인간이 자기확립과 경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언어철학자 빌헤름 흄볼트(Wilbelm Humbolt)는...
언어는 민족의 영혼이며 정신 기관이다라고 했다.
언어는 그 자체가 '행위'라는 것이다....
언어의 규칙과 인간 사고방식의 구조는 일치한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개념을 만들며, 나아가서 세계를 창조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도 이에 대응하는 언어 사용 능력 없이는 표현할 수 없다.
표현되지 않은 것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존재는 곧 언어이고,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세계와 타인을 만나며, 누구나 '세계 안의 존재'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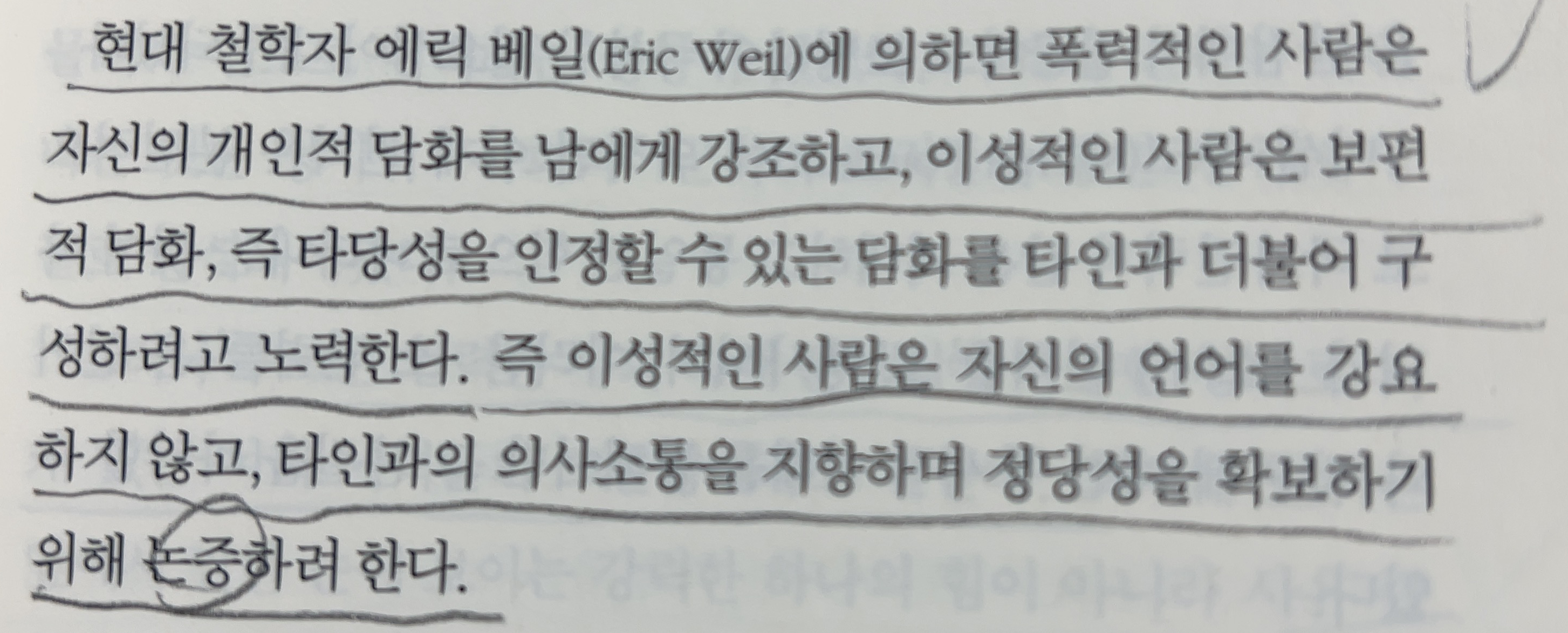
담론은 체계 밖에서 통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내리고, 또 체계 내부의 규범과 질서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권력 행사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푸코는 권력이 지식 없이는 행사될 수도 없지만, 권력은 스스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생산해내는 특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권력은 지식을 통해서 질서체계를 만들어내고, 정보를 독점하고 관리하면서 권력의 지배 아래 둔다.
따라서 권력을 부정하거나 벗어나는 지식은 '무질서와 혼란'으로 여겨지며 처벌과 탄압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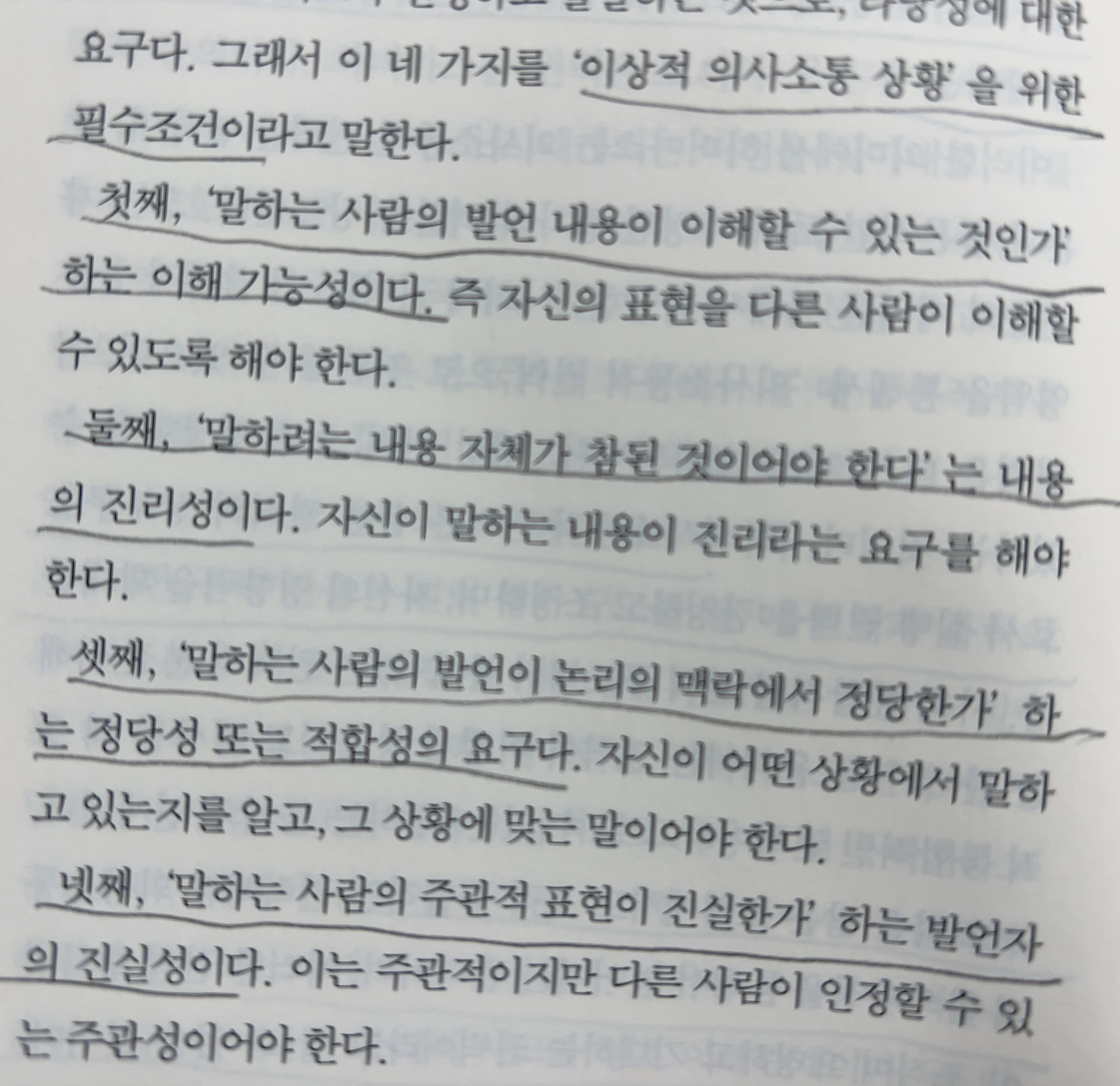
권력 또는 지도력은 책임의식과 그 본질이 같다.
하머마스와 아펠은 절차와 책임의식을 전제로 한 담론 권력을 오늘날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권력 모델로 제시하며,
보다 많은, 그리고 활발한 토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CEO의 언어는 방향을 제시한다)
처칠은...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해볼 때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실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미래를 담보로 하는 배짱 있는 태도에 약하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하므로, 미래에 대한 의지는 종종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대신해서 상대를 설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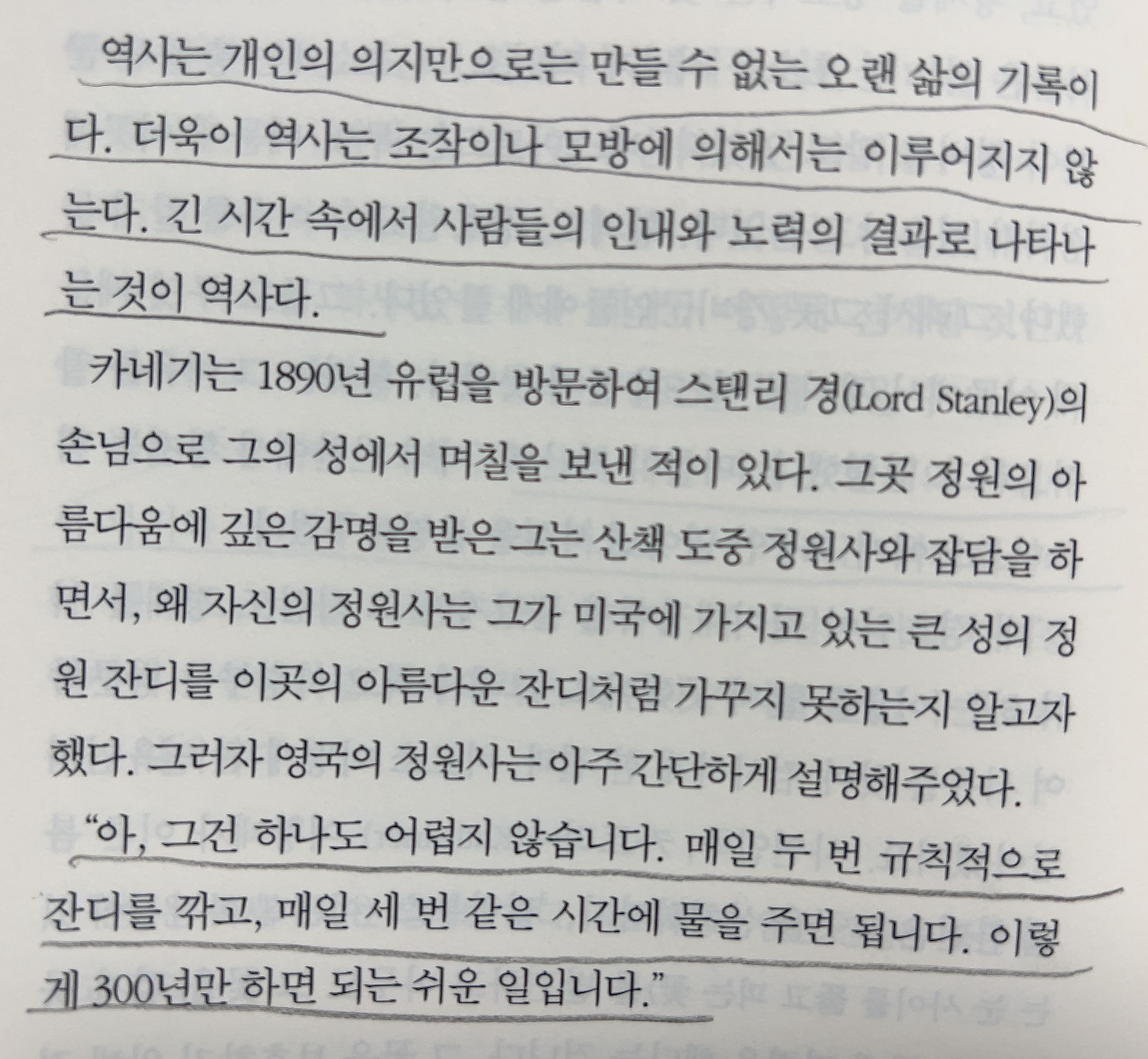
(CEO의 언어는 자기경영의 척도다)
사람은 오만해지면서 자기관리도 빛이 바랜다.
겸손함이야 말로 자기관리에 꼭 필요한 동반자이다.
(CEO의 언어는 관계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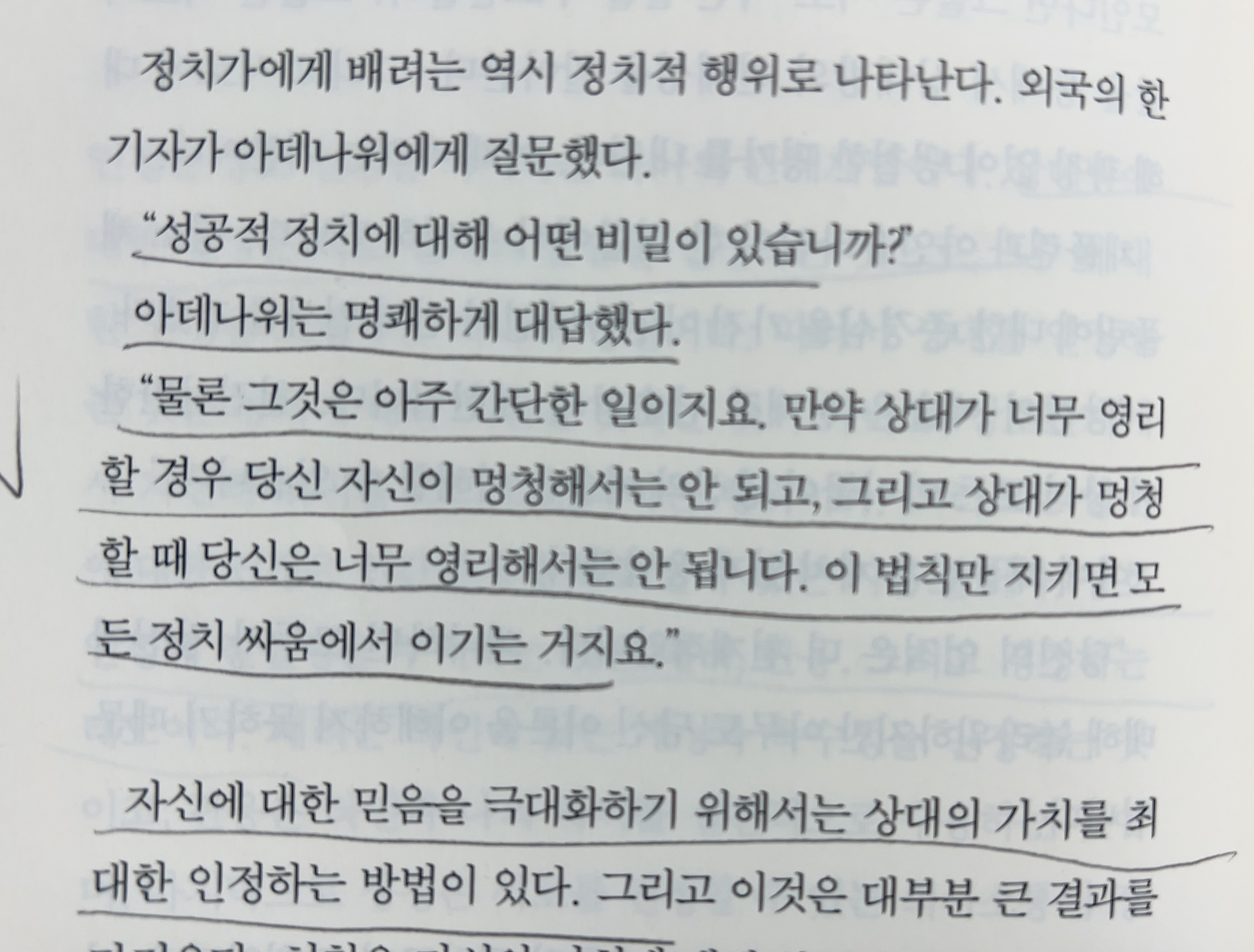
[ 자평 ] 멋지고 화려한 머리에....가볍고 별스럽지 않은 꼬리로 마무리....
그가 쓸 것처럼 기대해 줬던, 내용은 어디 있는가?
담론 능력은 어디 갔는가?
처칠, 아데나워, 비스마르크, 브란트,시저, 트로츠키, 드골, 체 게바라 등의 어록을 읽는 것과 뭐가 다를까?

'읽은 책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만화로 보는 영화의 역사 by 남무성/황의연 (0) | 2023.05.27 |
|---|---|
| 개발자에게 물어 보세요 by 제프 로슨 (0) | 2023.05.27 |
| 체호프 단편선 by 안톤 체호프 (박현섭 옮김, 민음사) (0) | 2023.05.27 |
| 다시, 사랑하는 시 하나를 갖고 싶다. (0) | 2023.05.20 |
| 체호프 단편선 by 안톤 체호프 (문예출판사) (0) | 2023.05.14 |
- Total
- Today
- Yesterday
- 개념
- 머신러닝 디자인 패턴
- 돈
- 인식론
- 게티어 문제
- 부정성 편향
- 양자역학
- 복잡계의 새로운 접근
-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 샤룩 칸
- 인공지능
- 당신은 AI를 개발하게 된다
- 고도를 기다리며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
- 경영혁신
- 지식론
- 게티어
- 데브옵스 도입 전략
- 파괴적 혁신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이노베이션
- 불교
- 직감하는 양자역학
- 혁신
- 안나 카레니나
- 상대성이론
- Ai
- 스케일의 법칙
- 최진석
- 사회물리학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