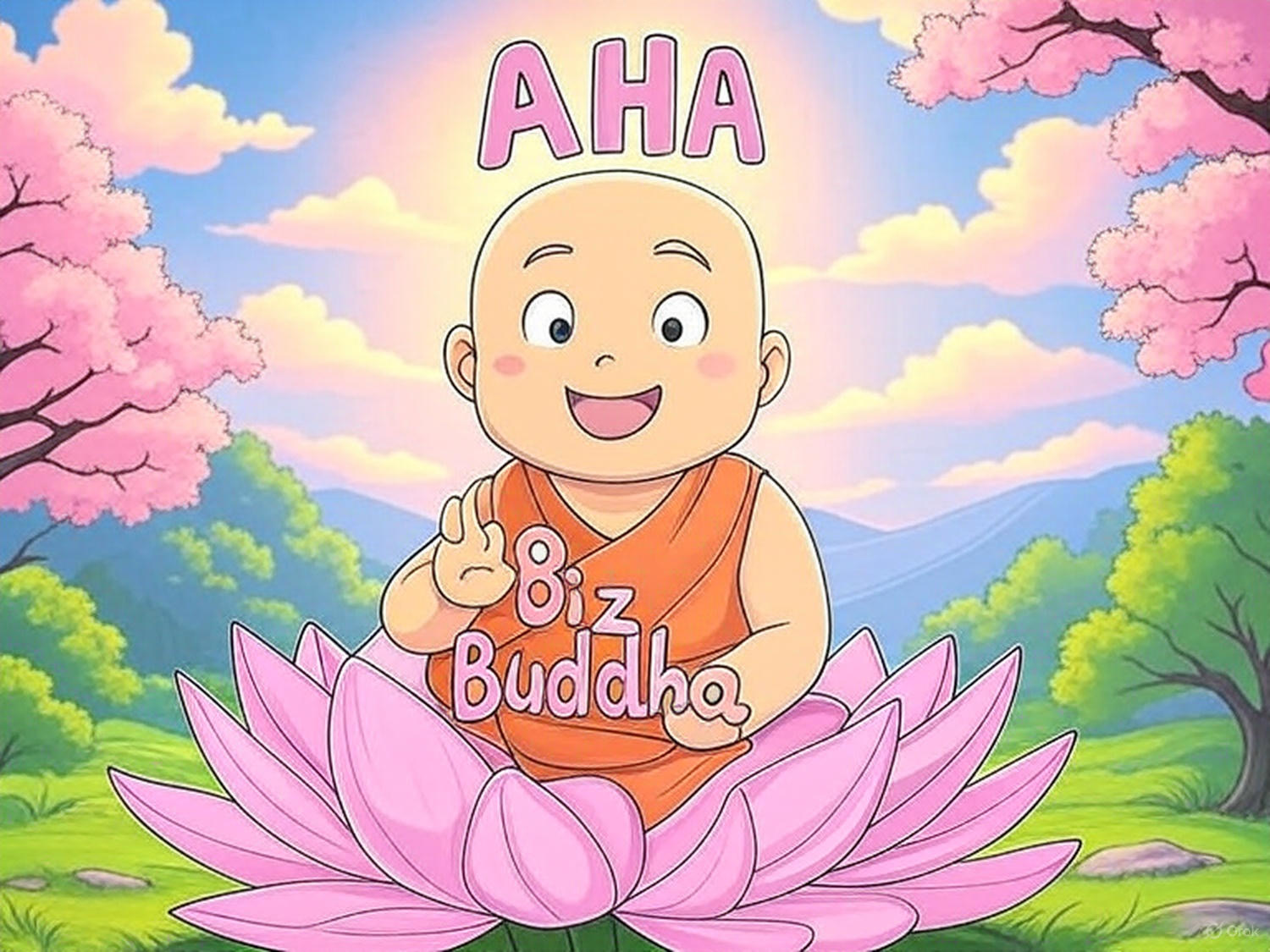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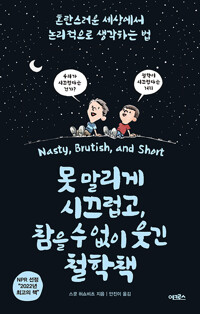
[ 밑줄/연결 ]
(8. 지식: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알 수 없을 떄)
데카르트는 삶이 꿈이라고 의심했던 최초의 인물은 아니었다...
도가 사상가인 장자가 2000년 전에 쓴 글이 있다..
<이하 장자의 나비 꿈 글>
데카르트....
지식을 확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기를 원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의심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러고도 뭔가가 살아남는다면, 즉 그가 의심할 수 없는 어떤 지식을 찾아낸다면 그 확고한 지식을 토대로 삼고 그 위에 다시 지식을 쌓아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데카르트의 관찰에 따르면 우리가 깨어 있는냐 꿈속에 있느냐와 무관하게 어떤 지식은 참이다.
꿈속에서도 정사각형의 변은 네 개다. 그리고 우리가 잠들어 있다고 해서 2+3= 5라는 사실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신은 그런 진실들에 의지할 수 있다. 설령 대부분의 지식에 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데카르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
다른 모든 게 의심스러웠을 때 데카르트는 그것만은 믿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질문에 대한 답을 '안다'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뭔가를 안다고 말하려면 그것에 대한 정당화 가능한 믿음(justified true belief)을 가져야 한다.
첫째, 뭔가를 안다고 말하려면 그것이 우리의 머리솟에 있어야 한다....또한 그 뭔가가 진실이기를 바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야 한다.
둘째, 진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의 믿음은 진실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믿음은 정당화가 가능해야 한다. 즉, 우리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추측은 안 되고, '매번 소풍날에는 비가 안 왔어"와 같은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1963년 게티어는 세쪽짜리 논문, <정당화 가능한 진실한 믿음은 지식인가?>
게티어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두 개의 짧은 반례를 제시했다.


린다 자그제브스키(Linda Zagzebski)는 게티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수많은 사람의 희망을 꺾어 버렸다.
자그제브스키는 JTB 이론을 어떻게 보완한다 해도, 어떤 틀린 내용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타당한 전제)에서 시작하는 한 게티어 문제는 항상 생긴다고 주장했다.
-----> Linda Trinkaus Zagzebski (Linda Trinkaus Zagzebski). 국내 이 분의 <윤릭학>에 대한 번역본이 있었다.
"지식론에서 지식 개념을 포함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지적인 덕 개념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해명하였다. "다고 한다.

다수의 철학자들은 자그제브스키가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게티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철학자들의 일부는 정당화, 믿음, 진실 같은 단순한 개념을 사용해서 지식을 분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실수였다고 이야기한다.
항상 모든 개념을 더 간단한 개념들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게티어 문제'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은 게티어가 아니었다.

게일 스타인(Gail Stine)...
인식론 학자는 지식에 관한 연구를 한다. 지식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획득하는가를 탐구한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스스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철학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의 지식은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한다......왜 그럴까?
스타인은..
어떤 단어들은 맥락에 따라 의미가 변한다. 그리고 대개는 그 변화를 쉽게 알아 차칠 수 있다.
나는 집에서는 키 큰 사람이지만 직장에서는 크지 않다. 왜 그럴까? 비교 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키가 크다'와 '키가 작다'라는 말들의 의미는 확실히 변화한다....
어떤 단어들은 맥락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비어 있다'라는 단어...
대부분의 맥락에서 '비어 있는'은 물질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뜻하지는 않는다. '비어 있는'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여러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 필요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스타인은 '안다'라는 단어도 '비어 있다'와 비슷하게 맥락에 민감하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뭔가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스타인에 의하면 그 기준들은 유의미한 대안에 의존하며, 유의미한 대안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한다.

거칠게 말한다면 스타인의 주장은 '회의주의자가 옳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기후변화를 예를 들면서..
'대체 왜 확실히 알아야 하는가?' 지금 행동하지 못하면 끔찍한 결과가 닥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확신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제법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의심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의심한다면 우리의 의심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
질문하는 사람들에 관해 질문해 보라.
ㅇ 이 사람은 정말로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건가?
ㅇ 이 사람은 증거에 관심이 있는가?
ㅇ 이 사람은 자신의 견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솔직히 인정할까, 아니면 그걸 감추려고 할까?
반드시 알아야만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항상 확률을 토대로 이성적 추론을 한다.
복권당첨이 될 수도 있다...그래서 당신은 당첨을 꿈꾼다. 그러나 당첨을 계획하지는 않는다.
회의론자들은 충족이 불가능한 기준을 고집하다.
가장 무서운 것들은 기후변화, 외계인,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이다.
시뮬레이션은 상상이 아니라 창조하는 행위이다.
[ 자평 ] 아들에게 설명할 정도로 쉽게 쓰여진 글은 어떤가 싶어서 봤다. 이 정도를 토론할 아이들이라면.....훌륭한 철학적 아이들...
대학 법학 및 철학과 교수가 아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려 쓴 책이듯 잃힌다.
<지식> 부분만 뽑아서 읽었다.
'읽은 책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심리학 개론 by 신 응섭 외 (0) | 2025.03.26 |
|---|---|
| 지식의 정의 in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by 일본도서관정보학회 (0) | 2025.03.26 |
| 노력 중독 by 에른스트 푀펠(Ernst Poppel) (0) | 2025.03.25 |
| 30초 철학 읽기 by 배리 로워 (Barry Loewer) (0) | 2025.03.25 |
| 5분 뚝딱 철학 - 생각의 역사2 by 김 필영 (0) | 2025.03.25 |
- Total
- Today
- Yesterday
- 후감각
- 돈
- 인식론
- 인공지능
- 개념
- 이노베이션
- 혁신
- 프레임워크
- 경영혁신
- 샤룩 칸
- 형식 지정 기법
- 사회물리학
- 생각
- 고도를 기다리며
- 안나 카레니나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불교
- 상대성이론
- 게티어
- MECE
- 지식의 구조화
- Ai
- 지식의 정의
- 부정성 편향
- 지식론
- 사고의 본질
- 최진석
- 게티어 문제
- 양자역학
- 파괴적 혁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