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밑줄/연결 ]
(서론: 20세기의 거대 내러티브)
나는 1870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지는 140년의 장기 20세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세기였다고 굳게 믿는다. 또한 사실상 인류의 보편적 조건이던 물질적 빈곤을 종식시킨 세기였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주제가 된 최초이 세기였다.
1870년 부터...
인류는 조직과 연구를 위한 제도 그리고 기술 - 본격적인 세계화, 기업 연구, 근대적 대기업 - 을 갖추었다. 이 세 가지가 열쇠였다. 이들의 힘으로 그전까지 인류를 지독한 가난에 가두었던 문을 열어젖힐 수 있었다.
ㅇㅇㅇㅇ
---> 성장을 가져 온 제도나 기술에 대해서는 다른 책에서도 언급이 있다. 대기업 산하의 연구소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이 정도로 생각하지는 못했었다.
"경제성장이 멈춘 이유를 수백 년간 향유해왔던 ‘쉽게 따는 과일’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쉽게 따는 과일은 세 가지로 광활한 토지, 혁신적인 신기술, 교육시스템이다. 이제 고성장 시대는 멈추었고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

---> "항상 새롭게 도전하라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정신에 따라 1925년 세워진 벨 연구소(Bell Labs)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기술 연구소다. 벨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의 숫자만 해도 3만 3,000개,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는 13명이나 된다. 우리는 트랜지스터, 광통신, 휴대전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세상에 살지만 그것을 벨 연구소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은 모른다. "

---->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급속하게 발달한 기술이 어떻게 수많은 인재와 자본과 연결되며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주었는지, 휴렛팩커드(HP), 제너럴 일렉트릭(GE),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전 세계를 흔드는 첨단기술기업들이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며 차례대로 나타났는지..."

시장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정의'의 유일한 개념은 부자들이 생각하기에 정의로운 것이었다. 재산 소유자들이 시장경제가 유념하는 유일한 존재기이 때문이었다. 덧붙여서, 시장경제는 비록 강력하기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즉 예를 들자면 시장경제만으로는 충분한 연구개발이나 환경의 질 혹은 심지어 완전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할 수 없다.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이사야 벌린은 18세기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를 인용 - "인류라는 구부러진 목재로부터 어떤 곧은 것도 만들어진 적이 없다." - 하며, "그러한 이유로 인간사에는 현실적으로는 물론이요 원리상으로조차도 완벽한 해결책이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1870 ~ 2010년은 기업 연구소와 관료적 대기업의 시대였다.
기업 연구소는 엔지니어 커뮤니티를 모아 경제성장의 동력을 충전하고, 관료적 대기업은 역량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여 발명의 성과를 활용했다.
기업 연구소, 대기업, 세계화라는 세 가지는 발전과 발명, 혁신과 활용, 글로벌 경제 통합의 동력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유용한 지식 가치 지수도 크게 올랐다.
국가와 정치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부의 창출과 분배는 다음의 네 가지를 이끌어 냈다.
첫째, 단연코 가장 중요한 것으로, 1870 ~2010년은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세기였다.
둘째, 세계가 여러 제국들이 아니라 주로 국민국가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셋째, 경제의 무게중심이 가치사슬을 지배하는 거대 과점기업들로 기울어졌다.
넷째, 정치 질서가 금권, 전통, 적합도, 리더의 카리스마나 역사의 운명에 대한 비밀 열쇠의 지식 등과 같은 것이 아니라, 보통 선거권이 행사하는 선거를 통해 정당화되는(적어도 명목적으르는) 세상을 만들었다.
경제성장의 승리는, 인류가 물질적 욕구에 거둔 승리가 아니라 물질적 욕구가 인류에게 거둔 승리이다.
우리가 욕구를 지배하기 위해 우리의 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우리의 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의 폭발로부터 나온 다섯 가지 중요한 과정들 및 힘들의 묶음이 이 책의 주요 테마를 이룰 것이다.
역사는 경제의 역사가 되었다.
부의 폭발이 일어나면서 장기 20세기는 경제 문제가 역사를 지배하는 최초의 세기가 되었다.
세계는 세계화되었다.
다른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이 주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렇게 중심적 요소가 되는 일은 예전에는 없었다.
기술이 가져온 풍요가 추동력이었다.
인간의 기술적 지식의 폭발....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양사한 문화 및 교육 시스템과 이전에 축적된 발전들을 새로운 연구의 기초로 삼게 해주는 통신 및 기억 수단등 뿐만 아니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자기들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회적 자원을 쏟아붓게끔 구조가 짜여진 시장경제가 필요했다.
----> AI시대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해 질 듯 한데...
----> 이런 주제로는 나도 2010년 즈음에 전 직장의 임원 지원 업무 시 한창 고민했던 기억이 나고, 그 흔적의 책들이 아직 창고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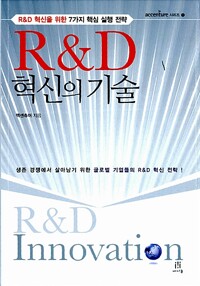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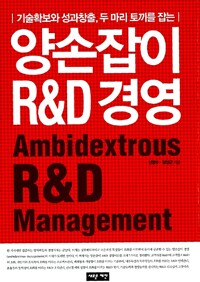

----> 새롭게 2025년 즈음에 이 주제로 읽기를 접해 보기 위해 사다 놓은 책이 몇 권 있다.

각국 정부는 관리의 실패에 봉착했으며,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을 낳았다.
각국 정부는 자기 조정적이지 못한 시장을 조정하여 번영을 유지하고 기회를 보장하며 상당한 수준의 평등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에 부닥쳤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하여는 거의 감조차 잡지 못했다.
각종 형태의 폭정이 휠씬 더 격렬하게 나타났다.
그 이전에 나타난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야수적이고 야만적이었다. 그리고 부의 폭발을 가져온 여러 힘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연결의 방식은 아주 이상하고 복잡하며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 자평 ]
'우리는 유토피아로 가고 있는가?' 라는 띠지의 질문에 (그런거 같지 않다는 공감에서) 궁금해서 읽었다.
대체로는 친숙한 내용이라, 서론과 16장. 재세계화, 정보기술, 초세계화 , 17장. 대침체와 빈약학 회복 및 결말 부분만 추려서 읽었다.
전반적인 내용은 그 전에 읽었던 로버트 J. 고든 (Robert J. Gordon) 교수의 책과 내용상으로 크게 다른 점은 없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다. 고든 교수가 다루는 시기도 1870년 ~ 2015년으로 비슷하다. 다만 미국 중심으로 다룬다는 차이가 있지만, 저자의 말처럼 이 시기는 미국이 주도한 시기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다만 고든 교수의 책에서 못 봤던 대기업의 역할, 산하 연구소의 기여 등은 대기업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을 다룬 토머스 K. 맥크로 (Thomas K. McCraw) 교수의 아래 책을 보면 좀 더 보강이 될 듯 하다. 내용은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1920년 ~ 2008년 금융위기 까지를 다루며 핵심은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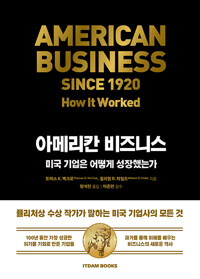
2025년 중국발 오푼형 AI인 딥시크의 충격으로 너도 나도 나라 전체가 흔들 흔들하다.
이런 시국에 마침 좋아하는 마리아나 마추카토 (Mariana Mazzucato) 소장이 신간이 나왔길래, 그 분의 오랜 책들을 다 끄집어 내어 다시 한번 읽어 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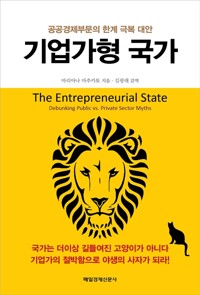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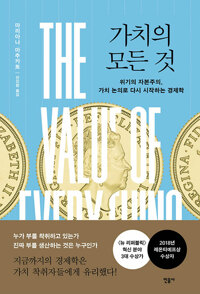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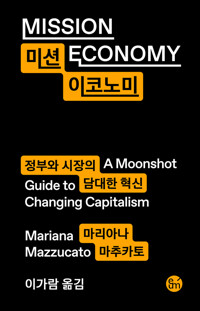
'평행우주 속의 경영 > 양적 성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퀄리티 투자 by 로렌스 커닝햄(Lawrence A. Cunningham (1) | 2025.02.25 |
|---|---|
| 더 좋은 주식의 발견 by 마이클 션 (30) | 2024.11.11 |
| 샘 울트먼의 스타트업 플레이북 by 샘 울트먼 (1) | 2023.11.25 |
| 트랙션 by 지노 워크먼 (1) | 2023.10.02 |
| 성취예측모형 by 최동석 (0) | 2023.07.09 |
- Total
- Today
- Yesterday
-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 파괴적 혁신
- 인공지능
- 이노베이션
- 안나 카레니나
- 양자역학
- 당신은 AI를 개발하게 된다
- 스케일의 법칙
- 샤룩 칸
- 게티어 문제
- 직감하는 양자역학
- 고도를 기다리며
- 돈
- 최진석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지식론
- 부정성 편향
- 머신러닝 디자인 패턴
- 게티어
- 경영혁신
- Ai
- 인식론
- 복잡계의 새로운 접근
- 불교
- 사회물리학
- 혁신
- 상대성이론
- 데브옵스 도입 전략
- 개념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