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무아'에 대한 글들을 읽고 싶어 휴가 기간에 교수들이 쓴 책을 구해 필요한 부분만 읽어 보았다.
2022년 현재 불교인문사회과학원장으로 계시는 김규칠교수 책과 대만 화판대학 철학교 지지엔즈 교수의 책이다.

(무아는 어떻게 가능한가)
붓다의 결론부터 말하면, '자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자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자아라는 있지도 않은 관념을 둘러싸고 맴도는 것으로, 어느 쪽이건 아직 속박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나'또는 '존재'라고 부르는 것이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의 흐름을 타고 (아니 흐름 자체이기도 하면서) 함께 움직이면서 상호 의존하는 물질적/정신적 구성 요소의 결합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괴로움이 따른다.
모든 법(또는 진리)는 무아다.
<담마파다(법구경)>의 277, 278, 279번째 경구다.

------------------------------------------------------------

(무아란 무엇인가)
만약 무아를 체득해 깨달을 수 있다면 대체로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의 방해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은 모두 반드시 '나'라는 토대에 의지해서 비로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 철학에도 무아의 주장이 있다.
(흄의 자아에 대한 의심)
18세기 철학자 흄은....어떤 사물이 존재한다고 공언할 때, 반드시 우리의 여러 경험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반드시 의심하게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등의 다양한 감정 기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아의 느낌일 뿐이지 결코 자아 그 자체는 아니다. 우리는 또 마음속 내면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생각의 흐름이지 결코 자아가 아니다. 그렇다면 자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자아라는 상상은 고통을 가져온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아는 단지 가상적인 존재일 뿐이지 않을까?
(자아는 단지 경험의 흐름이라는 집합일 뿐이다)
흄은 '자아란 사실 일련의 경험의 흐름'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아는 사실 허황된 것이다. 이 허구의 자아는 사실 불꽃과 인파와 흐르는 강물처럼 단지 인연에 따라 모인 현상일 뿐 존재하는 사물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곧 지각들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 역시 나의 지각의 총체인 것이 아니며, 어떤 인연이 모인 경우에 특정한 연속성을 이루어야만 '나'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 나는 끊임없는 인연의 모임 속에서 변하고, 그 이면에는 결코 어떠한 본질적인 것도 없다.
실존체가 없는 상황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많은 것들이 줄곧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나타나 어떤 인연이 모여드는 힘이 결집되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이 곧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성'이다.
(내가 없다면 누구를 위해 불교를 배울까? )
중간학파처럼 배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불교 이론도 분명히 있다.
(새로운 경험을 해야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진정으로 무아를 인식하려면 반드시 직접 몸소 증득하는 체증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무아를 직접 보고 증득해야 무아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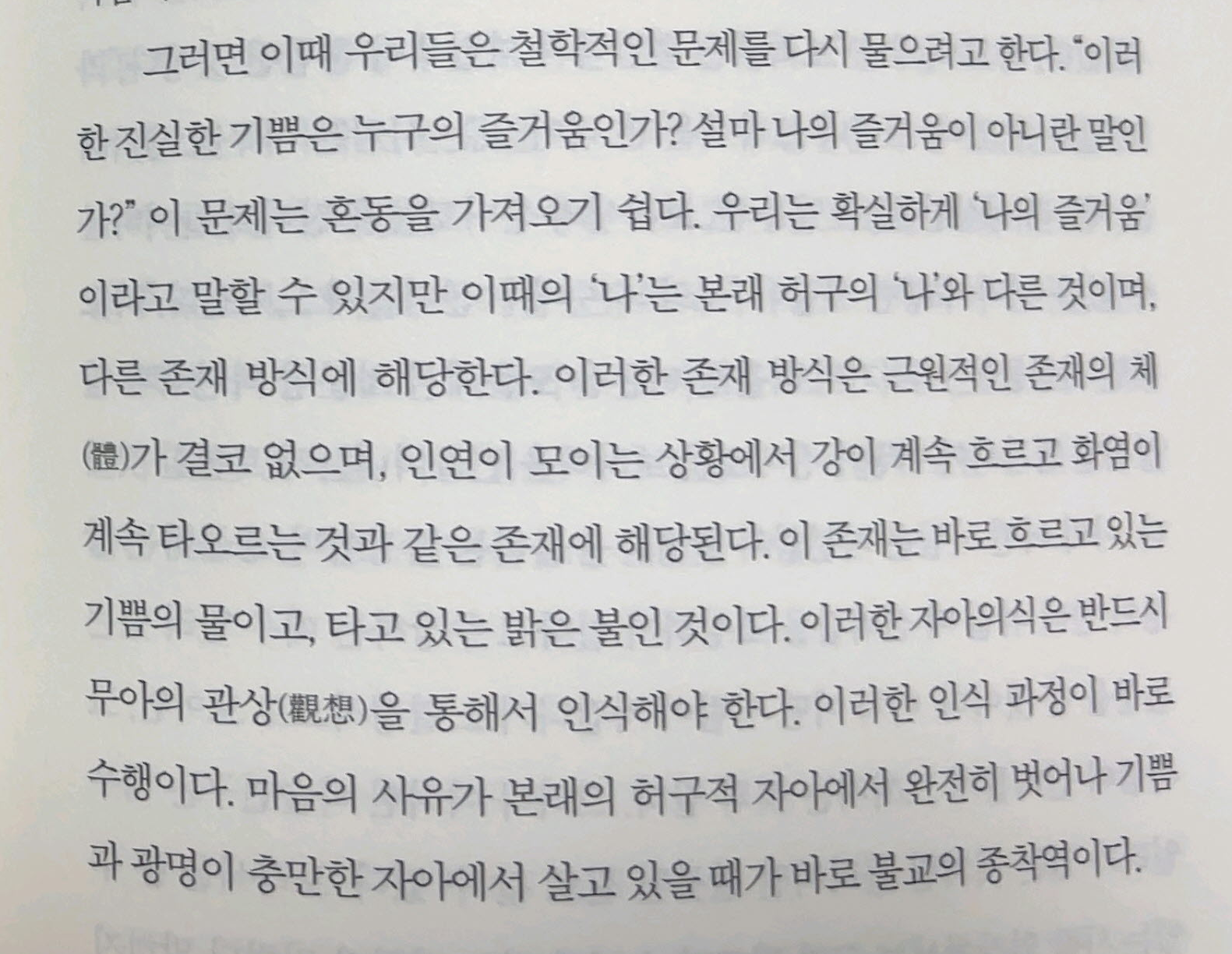
('일체개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개공'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항상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모든 생각, 지식, 가치관은 다 빈 것이다)
나는 '일체'를 모든 생각, 관념, 특히 가치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공'이라는 것을 이론의 기초가 결여되어 반드시 옳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가치관은 모두 공성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모두 텅 빈 것이다. 결코 하나의 진리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 원용할 수 있는 표준도 아니다.
(도를 깨달았다는 측정 기준)
만약 도를 깨달았다고 선언하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너무 빨리 절하지 마라. 종교를 이용해서 잇속을 차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철학과 불교의 논리 방법 비교)
주된 차이점은 도전할 수 없는 근거가 다르다는 것이다.
철학은 논리를 의심해서는 안 되고,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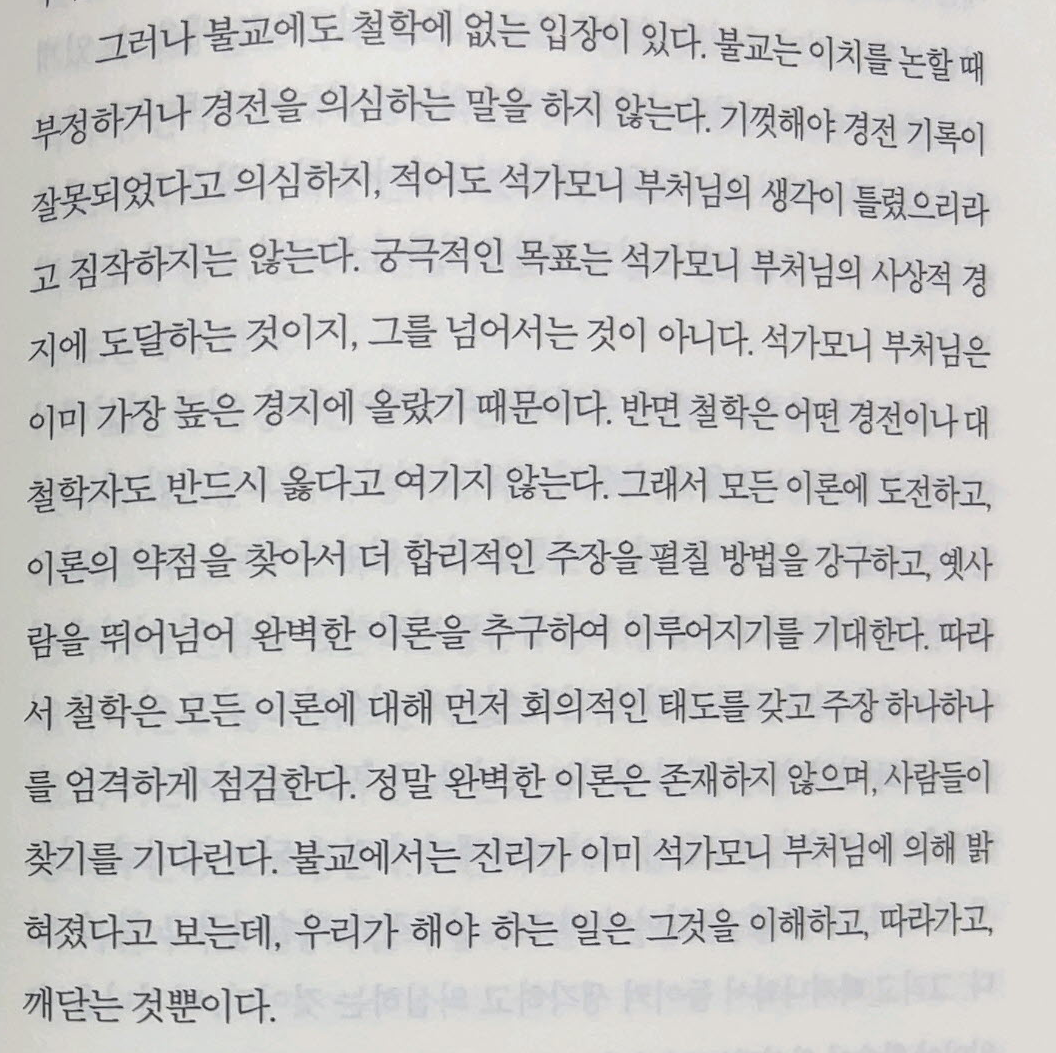
(철학은 의심에서 출발해서 끊임없이 더 좋은 이론을 찾는다)
(불교는 이미 존재하는 최고의 사상을 증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교를 배우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의 의심할 수 없다.
불교는 또 다른 큰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의 철학에는 없는 것으로, 바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증오'는 이론과는 다르다. 이론은 일종의 해석이다. 해석이 합리적일 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깨달음은 합리성 이외에 별도로 더 믿을만한 기반을 찾아내는 것이다.
(증오는 불교로 하여금 철학을 초월하게 한다)
봤으면 알게 되고, 봤으면 모든 이론을 버리고 진리를 직접 끌어안을 수 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깨달았다고 한 말이 진짜 깨달음인지 의심할 수 있다. 또 우리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해도, 여전히 그 사람이 잘못 판단했는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저 착각일 뿐일지 누가 알겠는가?
옛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의혹을 꺼내놓고 말하기 부끄러워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것을 확실히 하려면 반드시 수행을 해서 자신이 직접 목격해야 한다. 보기 전에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 \\
- Total
- Today
- Yesterday
- 샤룩 칸
- 이노베이션
- Ai
- 경영혁신
- 고도를 기다리며
-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 게티어 문제
- 직감하는 양자역학
- 안나 카레니나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머신러닝 디자인 패턴
- 돈
- 지식론
- 최진석
- 부정성 편향
- 게티어
- 양자역학
- 복잡계의 새로운 접근
- 파괴적 혁신
- 지식의 정의
- 혁신
- 인공지능
- 인식론
- 데브옵스 도입 전략
- 스케일의 법칙
- 개념
- 불교
- 당신은 AI를 개발하게 된다
- 상대성이론
- 사회물리학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