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밑줄/연결 ]
(럼스펠드의 X)
"세상에는 알려진 앎(known knowns)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아는 일이죠. 알려진 미지(known unknowns)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게다가 알려지지 않은 미지(unknowns unknowns)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미국 국방구 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Henry Rumsfeld, 1932 ~)가 이라크 침공 전인 2002년 2월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 알려지 앎, 알려진 모름,
알지 못함은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unknowns)와, 어떤 형태로든 '알지 못하는'는 무지(ignorance)로 분류된다.
X는 원래 럼스펠드의 분류 중에서는 '알려진 미지(Knows unknowns)'에 해당하는 기호였다....
알지 못함 중 미지다.
럼스펠드가 덧붙인 '알려지지 않은 미지(unknown unknowns)는 무지에 속한다.
알지 못하는 상태인 무지에는 앎에 접근하는 기회를 갖지 못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와 이미 알려진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발적 혹은 의도적 무지도 있다.
미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태이므로 의도적 미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지와 구별되기도 한다.
인류의 문명사나 지성사는 미지였던 X의 정체를 밝혀 온 과정이므로, X는 끊임없이 존재를 부정당하는 대상이다.
럼스펠드가 말한 알려진 미지는 달리 말하면 예상되는 위험이고, 알려지지 않은 미지는 예상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알려지지 않은 앎(unknown knowns)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럼스펠드가 이를 고의로 빠뜨렸다고 지적한다. 알려지지 않은 앎이란, 우리가 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기를 고의로 거부하는 일이다. '의도적 무지'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라크의 아부그라이브 교도서에서 미군이 포로에게 자행한 처참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취했던 딴청, 회피, 무시 등의 태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될 수 있다.

-------------------------------------
'X' 미지의 기호와 거룩한 상징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부호....
(조하리의 창, X 분석도구)
1955년 미국 심리학자 조셉 러프트(Joseph luft)와 헤링톤 잉엄(Harrington Ingham)이 만든 인간관계 이해도구
'나'를 인식의 대상으로 하며, 인식하는 주체를 나와 타자인 남으로 각각 나누어서 설명

공개영역이 넓은 개방형, 맹점영역이 넒은 주장형, 비밀영역이 넓은 신중형, 미지영역이 넓은 고립형
개인의 인간관계 뿐 아니라, 기업과 공공 조직 그리고 국가의 위기관리에 응용되곤 한다.
공개영역 : 조직에서는 '알려지 앎'(known knows)에 대응되고, 이 부분의 위기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차원의 예측 가능한 위험
맹점영역: 조직으로 가면 '알려진 미지'(known unknowns)에 대응. 전문가들은 이 영역의 위기로 소셜 미디어를 들기도 한다.
미지영역: 조직의 위기관리에서 '알려지지 않음 미지(unknown unknowns)'에 대응되고, 미리 알 수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도 없다.
비밀영역: '알려지지 않은 앎'(unknown knowns)에 대응되며, 위기를 외면하는 위험이다. 조직에 위기가 닥치는데오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비판을 가로막는 행위...
---------------------------------------
(커네핀 구조, Cynefin framework)
IBM이 의사결정을 위한 관리자의 상황인식 및 타인과의 차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분석도구로, 웨일즈 방언으로 '서식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의사결정자에게 문자를 공간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 감각을 제공한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다르기 때문이다....모든 문제를 명확한(Obvious), 복잡한(complicated), 복합의(complex), 혼돈의(chaotic)라는 4가지로 분류하고, 어디에도 속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을 때는 우선 무질서(disorder)로 둔다.

정보가 가득 찬 방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제어된 무시'를 통한 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
페르마의 정리는 1994년이 되어서야 앤드류 와일즈(Andrew Wiles, 1953~ )가 증명하게 된다. 한국인 김민형(1963~)도 앤드류 와일즈와 다른 방법으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해서, 한국인 최초로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과 정교수로 임용되었다.
---> 음 몰랐네.. 그렇군....이 분 책의 약력에는 없던데....겸손한 분.....아버지나 아들이나 두 분다 마음에 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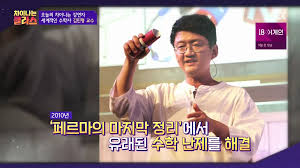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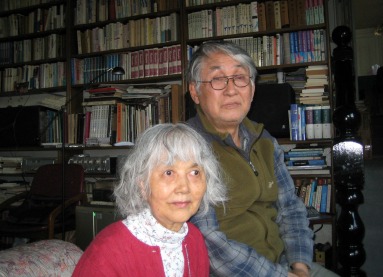
수학에서 미지수로 존재를 확인시킨 X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수학의 울타리를 넘어 알지 못하는 것 일반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앎과 모름의 경계가 분명해야 하는 과학 분야에서는 관찰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그 현상 자체를 X로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X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머리 겔만(Murray GellMann, 1929~2019)은 양성자나 중성자를 3개의 입자로 다시 나눌 수 있음을 보였고, 이 3개의 입자에 쿼크라는 이름을 붙였다. 쿼크는 난해하기로 악명 놓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피네간의 경야' 2부 4장 첫머리에 나오는 '마크 대왕을 위한 3개의 쿼크'라는 구절에서 따왔다. (Thress quarks for Muster Mark!)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전체 우주 에너지-질량의 95%를 차지하지만, 암흑 물질을 구성하는 표준모형의 기본입자나 그 조합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암흑에너지 역시 그 정체를 알 수 없다. 인류가 현재까지 밝혀낸 물리학 이론으로는 전체 에너지와 물질의 고작 5% 밖에 설명하지 못한다.
의식의 사전적 의미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작용이다. 인식이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이므로, 의식은 자신 또는 사물을 아는 일이 된다. 자기에 대한 의식인 자의식을 제외하면 의식이란 결국 사물을 파악하는 주관적 감정이다.
선동가 괴델스(Paul Joseph Goebbels, 1897~1945)은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을 섞어 100%의 거짓말보다 더 낫다는 거짓말 확산효과를 가져와 대중을 나치 뜻대로 움직였다.
[ 자평 ]
뭐....그냥......
'쉽게 살기 위한 공식 찾기 > 알고리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연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by 페르 박 (0) | 2021.06.20 |
|---|---|
| 수학이 일상에서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by 클라라 그리마 (0) | 2020.12.13 |
| 알고리즘 (0) | 2020.06.06 |
- Total
- Today
- Yesterday
- 지식론
- 복잡계의 새로운 접근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게티어
- 인공지능
- 불교
- 당신은 AI를 개발하게 된다
- 게티어 문제
-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 데브옵스 도입 전략
- 샤룩 칸
- Ai
- 안나 카레니나
- 최진석
- 개념
- 경영혁신
- 양자역학
- 직감하는 양자역학
- 인식론
- 스케일의 법칙
- 사회물리학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
- 부정성 편향
- 고도를 기다리며
- 혁신
- 상대성이론
- 머신러닝 디자인 패턴
- 돈
- 파괴적 혁신
- 이노베이션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