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덕경에 나와는 문구이며, 4장과 56장에 관련 내용이 있다.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 따라 역자마다 각양각색의 빛깔은 낸다.
도덕경 관련 서적 중 저 두 개의 장만 해설을 보고 정리해 본다.
다시 봐도 대충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번역/해설,
자기가 믿는 바를 도덕경에 투영시킨 번역/해설,
자기 번역/해설만이 옳다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계신 분도 있다. (한 20년 넘으신 듯)
내가 앞으로 다시 노자 도덕경을 읽는다면
오강남님의 <도덕경>을 다시 읽겠다.
1995년에 나온 책인데, 나는 이 보다 더 합당한 번역/해설서를 그 이후 보지 못했다

혹여 다시 사서 읽는다면....
김권태님의 <노자독법>(2012년)을 읽어 보겠다.
(물론 나는 99..99% 읽지 않을 것이다.
돈도 아깝고 더욱 더 내 시간이 더 아깝다.)

-------------------------------------------------
(노자독법 by 정대철)

道沖(도충), 而用之或不盈(이용지혹불영). 淵兮(연혜), 似萬物之宗 (사만물지종).
挫其銳(좌기예), 解其紛(해기분), 和其光(화기광),同其塵(동기진).
湛兮似或存(담혜사혹존), 吾不知誰之子(오부지수지자), 象帝之先(상제지선).
도는 텅 비어서 쓰임은 아마 차지 않을 것이다. 깊기도 깊어 만물의 근본(기원) 같구나.
그것은 날카로운 것을 꺾어 (본 모양을) 보니 (미차) 그것은 빛으로 어우러져 있고,
(반대로) 그것의 (서로 어우러져) 얼크러진 듯한 것을 풀어 (자세히 보려) 헤쳐보니
그것은 먼지와도 같(이 아무것도 없)구나.
맑기도 맑아, 아마 있는 것은 같은데,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겠도다.
(오직) '상제(높은 신)보다 먼저다'는 것밖에.
知者不言(지자불언), 言者不知(언자부지).
塞其兌(색기태), 閉其門(폐기문), 挫其銳(좌기예). 解其分(해기분), 和其光(화기광), 同其塵(동기진), 是謂玄同(시위현동).
故不可得而親(고불가득이친), 不可得而疏(불가득이소). 不可得而利(불가득이리), 不可得而害(불가득이해).
不可得而貴(불가득이귀),不可得而賤(불가득이천), 故爲天下貴(고위천하귀).
_ 道德經 제56장
(도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으며, (도를)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통로를 막고 문을 닫으니, 그의 예리한 것을 꺾으면, 빛으로 어우러졌고, 그의 섞이어진 것을 풀어보면, 먼지와 같다.
이것은 '가문 것으로 같음(현동玄同)'을 이르니라.
그러므로 (깨달은 자는) (깨달음을) 얻었을 뿐 (그 누구와 특별히) 가깝다하지 않고, 얻었을 뿐 멀다 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었을 뿐 (그 누구에게 특별히) 이롭다 하지 않고, 얻었을 뿐 해롭다 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었을 뿐 (그것으로 인해 특별히) 귀하다 하지 않고, 얻었을 뿐 천하다 하지 않는다.
까닭에 (도를 안은 자는) 천하의 귀함이 된다.
현동玄同이란 '색기태, 폐기문하여 좌기예부터 동기진까지'한 모습을 갖추는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속을 알 수 없다'다.
그러므로 현동한 자는 부평초와 같이 어디에 붙박여 있지 않다.
도를 얻었다고 해서 특별히 가깝거나 반대로 멀지 않고, 누구에게 이롭지도 반대로 해롭지도 않고,
또 귀하지도 천하지도 않다. 한마디로 그냥 그대로인 것만 같다.
어디 변화한 것도 어디 변화하는 것도 없어 보인다. 그는 그냥 그렇게 있다.
---------------------------------------------------------
(노자가 옳았다 by 도올 김용옥)


" 그 엉킴을 풀며, 그 빛이 튀지 않게 하며, 그 티끌이 고르게 되도록 한다."
이상적인 인격은 좌예, 해분, 화공, 동진을 구현하여 '현동'의 최고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다.
현동의 경지는 모든 세속의 편협한 인륜관계의 국한을 벗어나 있다.
그래서 천하에 비할 바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
(버려서 얻고 비워서 채우는 무위의 고전, 노자 도덕경 by 김원중)

道沖而用之(도충이용지), 或不盈(혹불영), 淵兮似萬物之宗 (연혜사만물지종).
挫其銳(좌기예), 解其紛(해기분), 和其光(화기동), 同其塵(동기진), 湛兮 似或存(담혜 사혹존).
吾不知誰之子(오부지수지자), 象帝之先( 상제지선).
_ 道德經 제4장
도는 (그릇처럼) 비어 있으면서도 작용하니 간혹 다하지 않을 듯 하고, 깊으면서도 만물의 근원인 것 같다.
날카로움을 꺾고, 엉클어짐을 풀어주면, (번쩍거리는) 빛을 부드럽게 하고, 그 더러움(세속)과 함께하니, 없어졌다가도 마치 존재하는 것 같다.
나는 (도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지만, 조물주보다는 먼저 있었으리라.
무의 작용이란 대립을 해소하고 번쩍거리는 빛을 가라앉혀 조화롭게 하면서 늘 비움을 실행하는 것이다.
"화광동진"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현동의 '현'은 깊고 그윽함이란 의미이고, '동'은 차별이 없다는 의미다.
------------------------------------------------------------------
(노자 도덕경 by 남만성)


"그 광채를 부드럽게 하여 티끌과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심원, 신비한 동일이라고 한다."
현동: 날카롭고 둔한 것. 밝고 어두운 것 등 양 극단의 것을 잘 조화하여 치우치우거나 부족함이 없는 동일한 상태로 하는 도의 심원하고 신비로운 작용. 즉 신비한 동일
특히 남의 눈에 드러나 보이는 광명을 흐리게 하여 티끌과 함께 있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남에게 드러나 보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밝은 광명을 티끌과 함께 조화시킨다.
티끌과 함께 하여도 스스로 더렵혀지거나 물들지 않고, 티끌로 하여금 정화되게 한다.
--------------------------------------------------
(전해 도덕경 by 장지청)


"밝은 빛을 부드럽게 하고 세상과 섞인다.
이를 일컬어 현동, 구별 없이 현묘하게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대중과 조화를 이룰 뿐 재능을 모두 드러내어 뽐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몸은 세상에 있어도 마음은 세상 밖에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사람은 '현동'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다.
'현동'은 가깝고 멂, 귀하고 천함, 이로움과 해로움의 관계가 사라진, 현묘하여 모두 조화를 이룬 경지이다.
노자는 모든 것이 구분됨 없이 혼연일체된 상태를 일컬어 '현동'이라 불렀다.
'현동'은 도에 동화된 상태로 인생 최고의 경지이다.
--------------------------------------------
(노자 쉽게 읽기 by 전명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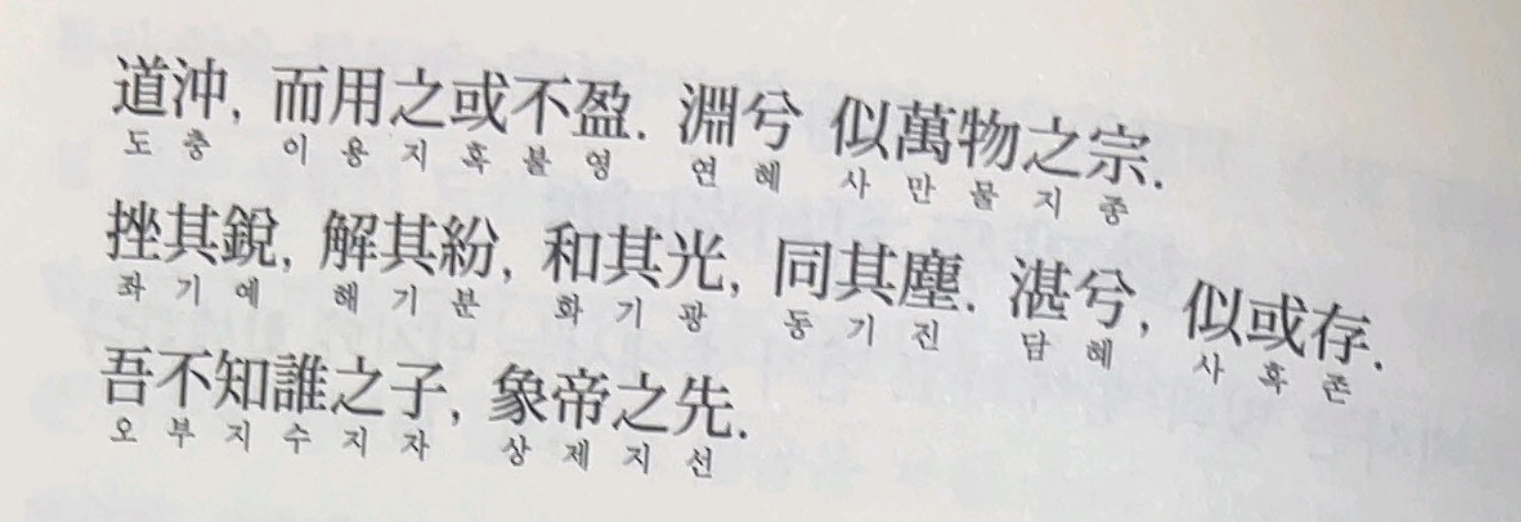

挫其銳(좌기예), 解其紛(해기분), 和其光(화기동), 同其塵(동기진) 의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리함을 드러내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고, 빛을 누그러뜨리고 먼지와 함께 한다." 이고
다른 하나는 "예리함을 드러내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고, 밝은 곳에서는 빛과 함께, 먼지 속에서는 먼지와 함께 한다." 이다.

-----------------------------------------------------
(노자, 최상의 덕은 물과 같다 by 차경남)



노자의 도는
온갖 날카로운 것을 꺾어 사람을 온화하게 하고, 온갖 얽힌 것을 풀어 세상을 평화롭게 하며,
온갖 번쩍거림을 죽여 부드럽게 하고, 그리하여 온갖 티끌들과도 구별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너무 번쩍거리려 하지 마라. 번쩍거리는 것,
그것은 유위다. 그것은 작위이며 조작이다. 그것은 위태롭다.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대의 재능을 과시하지 마라. 공을 이루었다고 거기에 머물려 하지 마라.
그리고 저 티끌 같은 세상과도 구별 없이 하나가 되라.
빛이 되는 건 좋지만 번쩍거리려 하지 마라.선을 행하는 건 좋지만 독선적이 되지는 마라.공을 이룬 건 좋지만 거기에 머물려 하지 마라.
티끌과 하나가 되라. (동기진)
만물 중 가장 보잘 것 없는 것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요, 가장 미천한 사물과 내가 소통한다는 뜻이다.
요컨데 '동기진'이란 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도의 소통인 것이다.


색기태, 즉 그 감각의 입구를 막고, 폐기문, 즉 그 욕망의 문을 닫아라. (52장에 나왔던 그대로)
좌기예는 그 엉킴을 풀고, 화기광, 그 광채를 누그러뜨리고, 동기진 즉 그 티끌과 하나가 되라. (4장에 나왔던 그대로)
------------------------------------------------------------------
(자연의 마음결 도덕경 by 김영희)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고, 다툼을 해결하고, 빛과 화합하고, 먼지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도를 품은 덕인의 삶이다.
빛과 화합하고 먼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덕인이 속세에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함을 의미한다.
-----------------------------------------------------------
(도덕경정해 by 이경숙)

道沖(도충), 而用之或不盈(이용지혹불영). 淵兮(연혜), 似萬物之宗 (사만물지종).
挫其銳(좌기예), 解其紛(해기분), 和其光(화기광),同其塵(동기진).
湛兮似或存(담혜사혹존), 吾不知誰之子(오부지수지자), 象帝之先(상제지선).
도는 깊어서 쓰고자 하면 채워져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실로 깊어서 만물의 근원인 듯싶다.
그것(도)의 날카로움을 꺾고, 복잡하게 얽힌 것을 풀면 (그 모습은) 빛이 어우러지는 광경과 같고 낱낱의 티끌과 같다.
깊이 잠겨있어서 어찌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는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상제보다는 먼저일 것이다.
도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생긴 물건인가?
이에 대한 답이 '화기광'과 '동기진'이다. 즉, '빛이 어우려져 춤추는 것과 같고 낱낱이 티끌과 같다'이다.
대부분의 학자가 이 장의 주제를 '도의 작용' 이라고 보고 노자의 본의와는 전혀 동떨어진 해석들을 해왔다.
일반적인 번역은
'도는 만물의 예리한 끝을 꺾어 그 분을 풀고, 그 빛을 부드럽게 하여 그 티끌에도 뒤섞이니, 깊고 깊어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또는
'도는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힘을 푼다. 그 빛이 뛰쳐남을 없게 하고 그 티끌을 고르게 한다.'는 식이다.
도저히 말이 안되는 이상한 소리들이다. 이런 이상한 번역들으로 점철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도덕경>이다.
---------------------------------------------------------------
(노자시집 by 김권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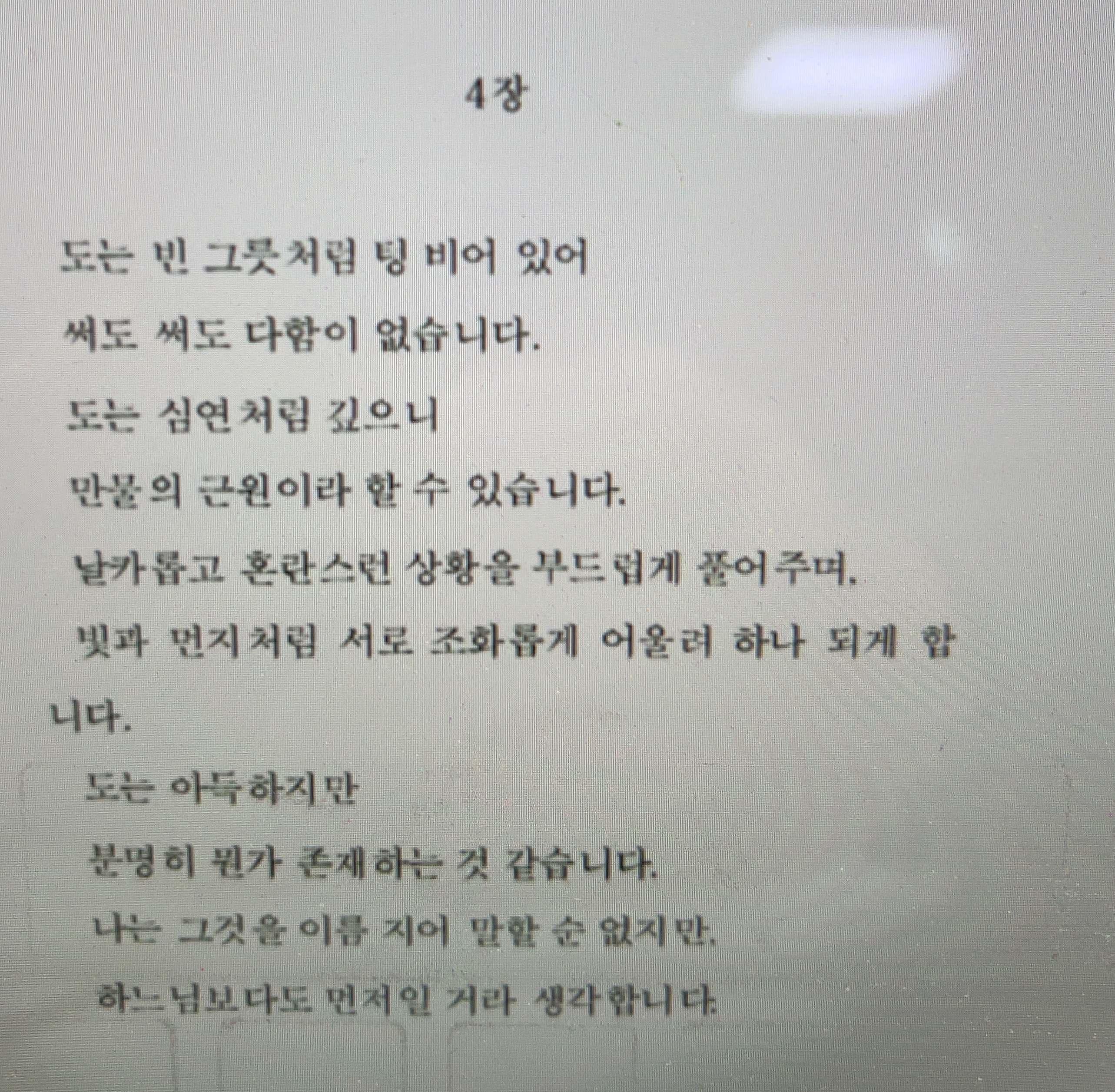
-----------------------------
(노자 도덕경 by 윤지산)


------------------------------------------------
(도덕경 by 소준섭)

道沖(도충), 而用之或不盈(이용지혹불영).
淵兮(연혜)! 似萬物之宗 (사만물지종).
挫其銳(좌기예), 解其紛(해기분), 和其光(화기광),同其塵(동기진).
湛兮(담혜)! 似或存(사혹존).
吾不知誰之子(오부지수지자).
象帝之先(상제지선).
도는 비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쓰임은 무궁무진하다.
심원하도다! 마치 만물의 조종과 같다.
그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갈라진 것을 풀며 그 빛을 조화롭게 하고 자신을 속세의 먼지와 섞는다.
보이지 않는 구나!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듯도 하다.
나는 도가 누구의 후손인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천제의 조상인 듯하다.
----------------------------------------------------------------
(도덕경 by 오강남)

너무 날카로운 것, 뒤엉킨 것, 분란스러운 것, 번쩍거리는 것 등은 자연적인 것이 못 된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균형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는 대립을 함께 포용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총체이기에, 이런 것을 둔화시키고 중화시켜서 둥글고 화통하고 부드럽게 해준다. 세상에서 자연적인 것치고 직선적인 것, 직각적인 것이 어디 있는가? 직선적이고 직각적인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도가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고, 엉킨 것을 풀어 주고, 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도 그처럼 너무 날카롭거나, 너무 얽히고 설킨 관계를 유지하거나, 너무 광내려 하거나, 너무 혼자 맑은 체 도도하게 굴거나 하지 말고 양쪽을 함께 포용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문의 <화기광, 동기진> 혹은 줄여서 <화광동진>은 <도덕경>의 명언 중에서 많이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지만
특히 흥미로운 것은 도가 티끌, 곧 티끌 세상과 하나가 되려 한다는 것이다.
도는 세상과 따로 떨어져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의 본모습 그대로가 도이다.
"도가 육신이 되어 세상과 하나되고, 그래서 세상에 거한다."는 이야기가 성립될 수도 있다.
'한줄 베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는 것에 대한, 무거움과 가벼움 (2) | 2023.09.10 |
|---|---|
|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루고 다치게 한다. (0) | 2023.03.28 |
| 대량 생산 방식 vs 혁신 (0) | 2022.12.11 |
| 권력 기반 관리 vs 가치 기반 관리 : 정신 모델 (0) | 2022.12.11 |
| '플랫폼 사업' 이라는 모델의 정리 (0) | 2022.12.11 |
- Total
- Today
- Yesterday
- 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
- 전략에 전략을 더하라
- 지승도
- 개발자에서 아키텍트로
- 상대성이론
-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 최진석
- 이노베이션
- 고도를 기다리며
- 경영혁신
- 파괴적 혁신
- 함께 있으면 피곤한 사람
- 돈
- 당신은 AI를 개발하게 된다
- 인공지능
- 스케일의 법칙
- 플랫폼의 시대
- Ai
-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 데브옵스 도입 전략
- 사회물리학
- 경계의 종말
- 안나 카레니나
- 혁신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부정성 편향
- 복잡계의 새로운 접근
- 불교
- 양자역학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